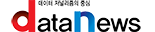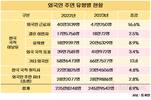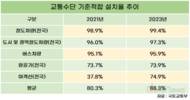자주쓴풀은 늦은 가을 보라색 별처럼 피는 꽃이다. 사진=조용경
바람이 조금은 쌀쌀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가을 날, 야트막한 산길을 걷다 보면 누렇게 변해가는 풀섶에 숨어서 별처럼 반짝이는 보라색의 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주쓴풀’ 입니다.
자주쓴풀은 쌍떡잎식물이며 용담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입니다.
우리나라 전역의 약간 건조하고 척박한 산지의 양지바른 곳에서 피어나는 가을꽃이지요.
키는 15∼30cm까지 자라며, 줄기가 꼿꼿하게 서는데, 전체적으로 검은 자주색이 돕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듯 잎과 뿌리는 쓴맛이 매우 강하답니다.
잎은 대나무 잎처럼 가늘고 길고, 끝이 뾰족한 바소꼴이며 두 잎씩 마주나기합니다. 잎의 길이는 2~4cm, 폭은 3~8mm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에 걸쳐 자주색의 꽃이 위에서부터 피어내려갑니다.

자주쓴풀의 수술 주변에는 연한 보라색의 털이 무성하다. 사진=조용경
꽃잎은 다섯 장이고 꽃잎에는 꽃잎보다 더 짙은 보라색의 줄이 있습니다.
꽃 가운데는 검은 색이 도는 짧은 암술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긴 수술이 있고, 수술 끝에 달린 꽃밥 역시 검은 자주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둘러싸듯 연한 보라색의 털들이 무수하게 나 있지요.
이 털들의 아래 쪽에 꿀샘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꽃들이 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피기 때문에 더 많은 꿀샘을 만들어 겨울잠을 준비하는 벌들을 유혹하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주쓴풀의 꽃말은 ‘지각(知覺)’ 혹은 ‘깨달음을 얻다’ 라고 합니다.
혹시 “늦게 피었지만 저도 꽃이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꽃말이 아니겠는지요…

자주쓴풀의 잎과 뿌리는 쓴맛이 매우 강하며, 약효가 강한 꽃이다. 사진=조용경
야생화 시집을 출간한 김승기 시인은 그의 시 ‘자주쓴풀’에서 ‘별 같은’ 모양과 그 ‘쓰디쓴’ 맛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들풀로 나서 짧은 생을 살지라도 / 마음은 하늘에서 별로 피어야 하느니라 (중략) / 몸부림치며 토해내는 그 쓴맛이 마침내 꽃을 피우는 것 아니겠느냐 / 울지도 못하는 쓰디쓴 고통이야 말로 다할 수 있으랴만…”
예로부터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주쓴풀 역시 한방에서는 잎이 달린 줄기를 건위제와 지사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의외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자주쓴풀'
이제부터는 만나게 되면 '아! 자주쓴풀!' 하며 아는 척 한 번 해주세요.
조용경 객원기자 / hansongp@gmail.com
야생화 사진작가
(사)글로벌인재경영원 이사장
전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