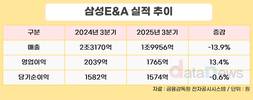미국의 최상위 10%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신용카드 대전이 가열되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와 제이피모건체이스(체이스)가 올 여름부터 프리미엄 신용카드의 연회비를 100만원대로 크게 올렸다. 이들 회사는 프리미엄 카드를,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과 각종 특권을 구매하는 럭셔리 ‘구독 서비스’로 진화시키고 있다. 양사는 △유에스오픈 테니스대회 등 주요 이벤트 참여, △주문제작 음식과 마사지 등이 포함된 회원전용 공항 라운지 이용 등 '경험 서비스'를 앞다퉈 내놨다.
미국 최상위 10% 가구가 소비자 구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이같은 프리미엄 신용카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미국 경제통신 블룸버그가 최근 보도했다. 이들 카드사는 △외식 크레딧, △명품 브랜드 할인, △유명 셰프 행사 참여, △콘서트 티켓 선예매 등 수천 달러(수백만원) 상당의 고객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티그룹과 캐피털 원 등 다른 카드 회사들도 카드 서비스 대전에 참전하고 있다.
이들 카드사는, △미국 최상위 소비자들의 막대한 지출에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 그리고 △이들이 기꺼이 지불하는 고액 연회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최상위 소비자들에게 높은 연회비는 되레 특장점(selling point)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단 카드를 사용하고 포인트를 모으기 시작하면, 새로운 카드로 전환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쉽게 떠나지 못하는 ‘락인(lock-in) 효과’도 있다.
신한·현대·삼성카드 등 국내 여신업계도 프리미엄 라운지, 여행 혜택, 콘서트 초청, 외식행사 등을 경쟁 중이다. 현대카드 ‘블랙’의 경우, 300만원의 연회비로 △라이프스타일 전담 매니저, △인천국제공항 라운지 서비스 △국내 특급호텔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 △50만원 바우처 4매 증정, △파인 다이닝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카드 ‘헤리티지 익스클루시브’, 신한카드 ‘더 프리미어 골드 에디션’ 등은 연회비 200만원, 우리카드 ‘투체어스 블랙’은 연회비 250만원을 각각 받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뉴욕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파크에서 열리는 유에스 오픈 테니스 대회장은 수많은 명품 차림의 관람객들과 고급 브랜드 홍보 부스들로 눈이 어지러웠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코트 안의 시합만큼 치열해졌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멕스와 체이스.
아멕스는 대회 3개월 전부터 자사 카드 회원에게, 이 티켓을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선 ‘센추리온 라운지’ 등 초호화 전용 공간을 운영했다. 체이스 역시, 대회장에 브이아이피(VIP) 라운지와 전용 테라스를 마련했다. 프리미엄 카드 전쟁은 스포츠 산업을 넘어 문화·여행과 패션 행사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25년 들어 양사는 초고가 카드의 연회비를 크게 올렸다. 체이스는 ‘사파이어 리저브’ 카드를 550달러(약 78만 8425 원)에서 795달러(약 113만 9791.5 원)로 인상했다.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의 연회비는 695달러(약 99만 6282.5 원)에서 895달러(약 128만 1192.5 원)로 뛰었다. 이에 대응해, 씨티그룹은 지난 2021년 단종했던 프리미엄 카드 ‘스트래터 엘리트’(595달러·약 85만 2932.5 원)를 부활시켰다.
이 연회비 인상의 본질은 “부자 고객 확보 경쟁(enrollment race)”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신규 가입 시 이들 카드사는 수십만 마일의 포인트를 주며, 각종 혜택은 다음과 같다. △유명 셰프의 프라이빗 디너 초대권, △애플 뮤직, 도어대시(음식배달서비스) 무료 구독, △콘서트·레스토랑 사전 예약권, △우버 크레딧과 백화점 쇼핑 크레딧, △고급 체육관 할인, △호텔 숙박권 등. 결국, 카드를 소지하는 것 자체가 ‘지위의 상징’이 된 셈이다.
프리미엄 카드는 과거, 출장 많은 비즈니스맨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엠지(MZ)세대 부유층이 주 타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아멕스는 플래티넘 카드 신규 가입자의 75%가 MZ세대라고 밝혔다. 이 세대는 기존보다 자산 수준이 높고, ‘고급스러운 경험’을 중시한다.
아멕스는 1890년대부터 여행자 수표로 부유층 시장을 장악해왔다. 1984년 ‘플래티넘 카드’를 출시하며 ‘VIP 서비스’ 개념을 확립했고, 1999년엔 초고가 ‘센추리온 카드’를 선보였다. 그러나 2015년 체이스가 ‘사파이어 리저브’를 내놓으며 아멕스 독주에 균열이 생겼다. 이 카드의 출시 당시, 1500달러(약 215만 700 원) 상당의 보너스 포인트와 금속 재질 디자인이 화제가 되며 수백만 명이 몰렸다. 체이스는 이 전략으로 젊은 전문직 고객을 흡수, 그들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투자·자산관리 등 은행의 다른 서비스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아멕스는 다시 이에 맞서, 공항 라운지·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인수 등으로 반격했다. 체이스도 여행 예약 플랫폼과 레스토랑 사이트를 인수하며 2라운드 경쟁을 시작했다. 양사 서비스는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럭셔리 이벤트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체이스는 유명 셰프의 시식회, 한정판 굿즈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멕스는 팝업스토어, 패션 위크 VIP 초대 등으로 젊은 부유층을 공략중이다. 양사의 경쟁에, 캐피탈 원은 미술 전시·공연 협찬을 통해 ‘예술 카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카드를 통한 ‘경험경제(Experience Economy)’ 경쟁이다. 고객이 실제로 혜택은 다 쓰지 못해도, ‘소속감’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상위 10% 가구는 연소득이 25만 달러 (약 3억 5850만 원) 이상이다. 이들이 전체 소비의 절반을 차지한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이들을 잡는 것이 수익의 핵심이다. 이 그룹은 빚을 잘 갚아 이자 수익은 적지만, 대신 거래 규모와 수수료 수입이 막대하다.
아멕스는 “고객 유지율 98%”를 자랑하며, 체이스는 “부유층 고객의 지갑 점유율이 우리 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말한다. 결국 ‘프리미엄 카드 전쟁’은 부의 양극화가 만든 금융산업의 새로운 전선이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사들은 회원과 가맹점이라는 두 그룹으로부터 수입의 대부분을 얻는다. 회원은 소비자로서 수수료와 이자를 지불한다. 그리고 가맹점은 모든 거래액의 일정 비율로 가맹점 수수료(interchange fees)를 지불한다.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율은 미국에서 1%~3.5%다. 프리미엄 카드는 때때로 이보다 더 높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비용이 더 높은 가격의 형태로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이 수수료에 상한선을 둔다. 이 규제 때문에, 한국의 경우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4% 이하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규제 움직임의 가능성이, 프리미엄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 한 가지 이유라고 결제 산업 컨설턴트들은 말한다. 소비자들이 연회비를 서비스 세트와 할인 쿠폰을 위해 구매하는 구독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규제와 입법적 제한이 있더라도, 카드회사들은 여전히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신용카드 비교업체인 포인트가이는 “카드 회사들은 프리미엄 카드의 연회비를 올려 회원들을 솎아내는 방식으로, 가장 수익성이 없는 카드 호퍼(card-hoppers)들을 단념시키려 한다”며 “모두가 나이트클럽의 VIP 구역에 있다면, 아무도 VIP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카드회사들의 공항 라운지 과밀을 완화하는 등 회원 서비스가 더욱 프리미엄처럼 느껴지도록 돕는다는 것.
카드 전문가들 중 아무도 연회비 895달러가 청구 상한선에 근접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수퍼 프리미엄 사교 클럽과 컨트리클럽은, 높은 연회비와 대기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많은 소비자는 수수료 인상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단념하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다. 일단 애플페이와 구글 월렛에 카드를 담고, 단골 항공사 계정에 연결하고, 포인트를 모으기 시작하면, 전환이 어렵다. 새로운 포인트 구조를 가진 새 카드로 전환하고 새 혜택이 실제로 생각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번거로움은 너무나 성가시다. 일단 들어오면, 당신은 아마도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권세인 기자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