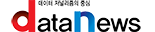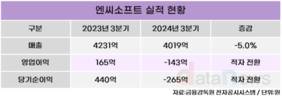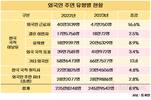▲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안중근 의사 둘째 아들 안준생은 1939년 10월 7일 자신이 거주하던 상해(上海)에서 경성(서울)으로 건너와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 총독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보리사(박문사:博文寺)를 참배, 향불을 피우면서 아버지의 죄를 사죄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둘째 아들인 이토 분키치伊藤文吉)를 조선호텔에서 만나 부끄럽다며 이처럼 고백했다. 그는 사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안중근의 위패까지 보자기에서 꺼냈다.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잘못을 가리면 무엇하겠나?"
이토 분키치는 큰 시혜를 배풀기라도 하듯 이같인 뇌까리며 다음날 박문사를 함께 참배키로 한 뒤 헤어졌다.
이 같은 ‘안준생의 사죄 퍼포먼스’는 일본에 의해 기획됐다. 한국과 일본의 정신적 통합을 통해 전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목적으로 이런 쇼를 기획한 것이다. 총독부 외사국장의 주선 하에 이뤄졌다. 조선의 내로라하는 지식인들조차 거의 모두 친일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연출도 진행된 것이다. 당시 매일신보에는 극적대면(劇的對面) 여형약제(如兄若弟:형제처럼 친하다), 吳越30年永釋!(오나라와 월나라 적개심이 30년만에 영구적으로 풀리다) 등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러한 아픔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같아 씁쓸하다. 안준생이 찾아 향불을 피우며 사죄의 무릅을 꿇은 곳 박문사는 현재 신라호텔 영빈관 자리다. 일제강점기에 서울 중구 장충단공원 동쪽, 지금의 신라호텔 자리에 있던 일본 조동종(曹洞宗) 사찰. 장충단은 본래 을미사변 때 피살된 시위연대장 홍계훈(洪啓薰)과 궁내부대신 이경직(李耕稙) 등을 기리기 위해 대한제국 고종이 쌓은 제단이다. 이곳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에 대한 항일 감정을 상징하는 장소였기에 1919년에 일제가 장충단 자리를 공원으로 바꿨다. 조선총독부는 장충단을 공원화한 데 이어 1932년에는 공원 동쪽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추모하기 위한 사찰을 짓고 사찰이 자리 잡은 언덕을 춘무산(春畝山)이라고 불렀다. 박문사라는 이름은 이등박문(伊藤博文)에서 따왔고, 춘무는 이토의 호이다. 박문사는 이토의 23주기 기일인 1932년 10월 26일에 완공되었다.
낙성식에는 조선총독 우가키 카즈시게(宇垣一成)와 이광수ㆍ최린ㆍ윤덕영 등의 친일부역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박문사는 ‘조선 초대총감 이토 히로부미의 훈업을 영구히 후세에 전’하고 ‘일본불교 진흥 및 일본인과 조선인의 굳은 정신적 결합’을 도모하기 위해 진 절이다. 일제는 박문사를 건축하면서 광화문의 석재, 경복궁 선원전과 부속 건물, 남별궁의 석고각 등을 가져와 썼으며, 경희궁 정문인 흥화문을 떼어 정문으로 삼는 일을 저질렀다. 1937년에는 일본군 육탄 3용사의 동상을 세워 대륙침략을 위한 ‘정신기지’로 삼기도 했다. 1939년에는 이곳에서 이토를 포함하여 이용구ㆍ송병준ㆍ이완용 등 경술국치 공로자를 위한 감사 위령제가 열리기도 했다. 이용구의 아들인 이석규가 흑룡회와 함께 개최한 이 행사에는 이광수ㆍ최린ㆍ윤덕영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문사는 대한민국 건국 후 철거되었고, 박문사터로 추정되는 자리에는 신라호텔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이토 히로부미의 ‘추모’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신라호텔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다. 일제는 박문사 계단을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기 위해 불교의 의미까지 곁들여 108개로 설계했다.
서울시는 최근 박문사 자리에 신축 한옥호텔을 허가하면서 조건부 승인을 했다. 문화재이니 이 계단을 잘 보존하라는 것이다. 8년 만에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객실 수는 207개에서 91개로 대폭 줄었고, 당초 4층에서 3층, 다시 2층으로 층수도 낮아졌다.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건축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와 비슷한 슬픈 역사는 또 있다. 서울 시청이다. 서울시청을 가보면 헐리다만 건물이 있다. 유적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어설프다. 그렇다고 예술품도 아니다. 일본은 한국을 점령한 뒤 대표적인 건물을 건축하면서 일본(日本)으로 지었다. 현재 경북궁 정문 자리, 즉 옛 중앙청 건물을 日로, 시청건물을 本으로 지었다.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런 모양을 나오게 했다. 일본인 중에는 “한국=일본”이라며 이를 자랑하기도 한다. 日모양의 중앙청건물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제의 흔적을 지우는 차원에서 아예 헐어버리고, 경북궁의 정문을 복원시켰다. 그런데 서울시청은 아직도 일부가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오세훈 시장 시절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아 결국 ‘本’ 모양의 일부를 남겨놓고 신청사를 지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납득할 수 없다. 108계단과 서울시청 옛 건물 일부 보존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픔이 있는 역사도 역사”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아픈 역사를 설명하는 기록물이라도 눈에 띄게 설치해야 할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중 신라호텔의 108개 돌계단이, 또 서울 시청의 헐다만 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어설픈 지식이 또 다른 비극을 부르는 법이다. 역사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chang@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