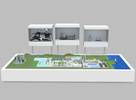![[취재]한화큐셀, 통관 지연으로 4분기 적자 전망…공급망 다각화 시험대](/data/photos/cdn/20251148/art_1763968435.png)
한화큐셀이 미국 세관의 통관 심사 강화로 셀 공급에 차질을 겪으면서 올해 3분기 실적이 둔화됐다. 모듈 제조 부문의 적자가 확대된 가운데, 통관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4분기에는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데이터뉴스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한화솔루션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재생에너지부문(이하 한화큐셀)의 모듈 및 기타 사업이 90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은 2024년 4분기 흑자 전환한 뒤 미국 태양광 시장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까지 영업이익(1562억 원)을 꾸준히 늘렸다. 그러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79억 원으로 감소했다.
사업별로는 주택용 에너지 사업(796억 원)과 개발자산 매각/EPC(187억 원)가 선전했지만, 핵심인 모듈 제조 사업이 부진했다. 모듈 부문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682억 원을 제외하면 1586억 원의 적자를 냈다.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의 통관 강화다. 한화큐셀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셀을 생산해 미국 조지아주 모듈 공장으로 공급하는데, CBP가 올해 8월부터 위구르강제노동금지법(UFLPA) 적용을 강화하면서 일부 셀의 통관이 보류됐다.
UFLPA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됐으며,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한 모든 물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강화 조치는 단순한 인권 조치라기보다 중국산 저가 공급망 배제를 통한 미국 내 제조 경쟁력 확보, 제3국을 통한 우회 조달 차단 등 전략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태양광 제조공정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진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중국 론지(LONGi) 등에서 웨이퍼를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큐셀은 이번에 통관이 보류된 제품에 신장산 소재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산’이 아니라 ‘신장 지역산’ 원료 사용 여부이며, 당사는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통관 보류는 위반 판정이 아니라 확인 절차로, 공급망을 소명하면 다시 반입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글로벌 제조사들도 동일한 이슈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관 지연으로 4분기 신재생에너지 실적은 악화될 전망이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3분기 실적발표에서 이로인해 신재생에너지가 4분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모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가동률 하락에 따른 고정비 부담, AMPC 감소로 영업적자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통관 이슈가 있지만 한화큐셀이 지난 8월부터 국내 기업 OCI홀딩스의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는 등 비중국 공급망을 구축해 내년부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기존 셀·모듈 중심에서 잉곳·웨이퍼까지 밸류체인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모듈 공장에 잉곳, 웨이퍼, 셀 제조라인을 증설했으며, 잉곳과 웨이퍼는 시제품 생산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사용할 예정이다.
셀은 장비 결함으로 양산이 올해 4분기에서 내년으로 지연됐으나, 당분간 미국에서 생산한 잉곳/웨이퍼를 한국과 말레이시아 셀 공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 - 한화큐셀, 미국 태양광 모듈 재활용 사업 출범 (2025/06/10)
- - 수장 바꾼 한화큐셀, 북미서 불확실성과의 전쟁 (2024/07/31)
최신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