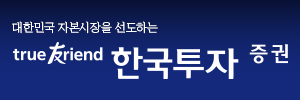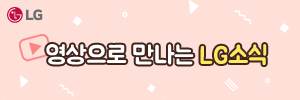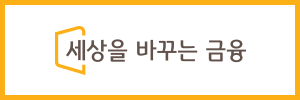삼성SDI, "지금이 저점"…ESS 발판은 다졌다
ESS 매출 비중 2024년 14.6%→2026년 26.5% 확대 전망…NCA 기반 ESS 신제품은 올해와 내년 물량 확보 중
![[취재] 삼성SDI, 지금이 저점…ESS 발판은 다졌다](/data/photos/cdn/20251044/art_1761724675.png)
삼성SDI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소비 증가와 친환경 발전 확대라는 거대한 흐름에 대응,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
31일 데이터뉴스가 증권사 리포트를 종합·분석한 결과, 삼성SDI의 ESS 매출 비중은 2024년 14.6%(추정)에서 2025년 22.9%, 2026년 26.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ESS 사업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삼성SDI는 2025년 3분기 591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유럽 고객사 판매 부진과 북미 공장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AMPC(195억 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전기차(EV) 고객사로부터의 보상금 수령이 4분기로 이연됐고, 미국 관세 부담으로 ESS 부문이 적자로 전환한 영향도 있었다.
다만, 삼성SDI는 3분기를 저점으로, 단기적으로 ESS 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며 수익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는 각형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기반 ‘SBB 1.7’과 각형 리튬·인산철(LFP) 기반 ‘SBB 2.0’의 양산을 추진하고 있다. NCA는 LFP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지만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삼성SDI는 두 제품 모두에 직분사 소화시스템 등 열전파 차단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현재 삼성SDI는 비중국계 기업 중 ESS용 각형 셀을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로 북미 ESS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각형은 알루미늄 캔 타입의 외관구조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열 방출이 용이하며, 고에너지밀도 구현에 유리해 주요 완성차 업체(OEM)의 선호도가 높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국내 최초로 진행된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 물량(563MW 규모)의 76%를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ESS 배터리는 울산 공장에서 NCA 기반으로 생산되고 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현지 생산능력(캐파)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는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공장(JV)의 일부 EV라인을 NCA기반 ESS 라인(6~7GWh 추정)으로 전환해 가동 중이며, 내년 4분기에는 LFP 기반 ESS 양산도 시작해 북미 ESS 생산 능력을 총 약 30GWh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현지 생산 증가는 AMPC 확대로 이어져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조용휘 삼성SDI ESS비즈니스팀장은 "미국 ESS 시장은 배터리 출하기준 2025년 약 80GWh에서 2030년 130GWh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올해 ESS 배터리 수요 대비 현지 캐파로 커버 가능한 비중은 약 30%고, 향후 PFE 제한 기준 충족을 위해 중국산 사용이 감소해 현지 수요 대비 캐파 부족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는 이미 이번 달 양산을 시작한 NCA 기반 ESS 라인 신제품에 대해 미국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올해와 내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LFP 라인에 대해서도 여러 고객사와 중장기 협력을 논의하며 수주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혜연 기자 phy@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